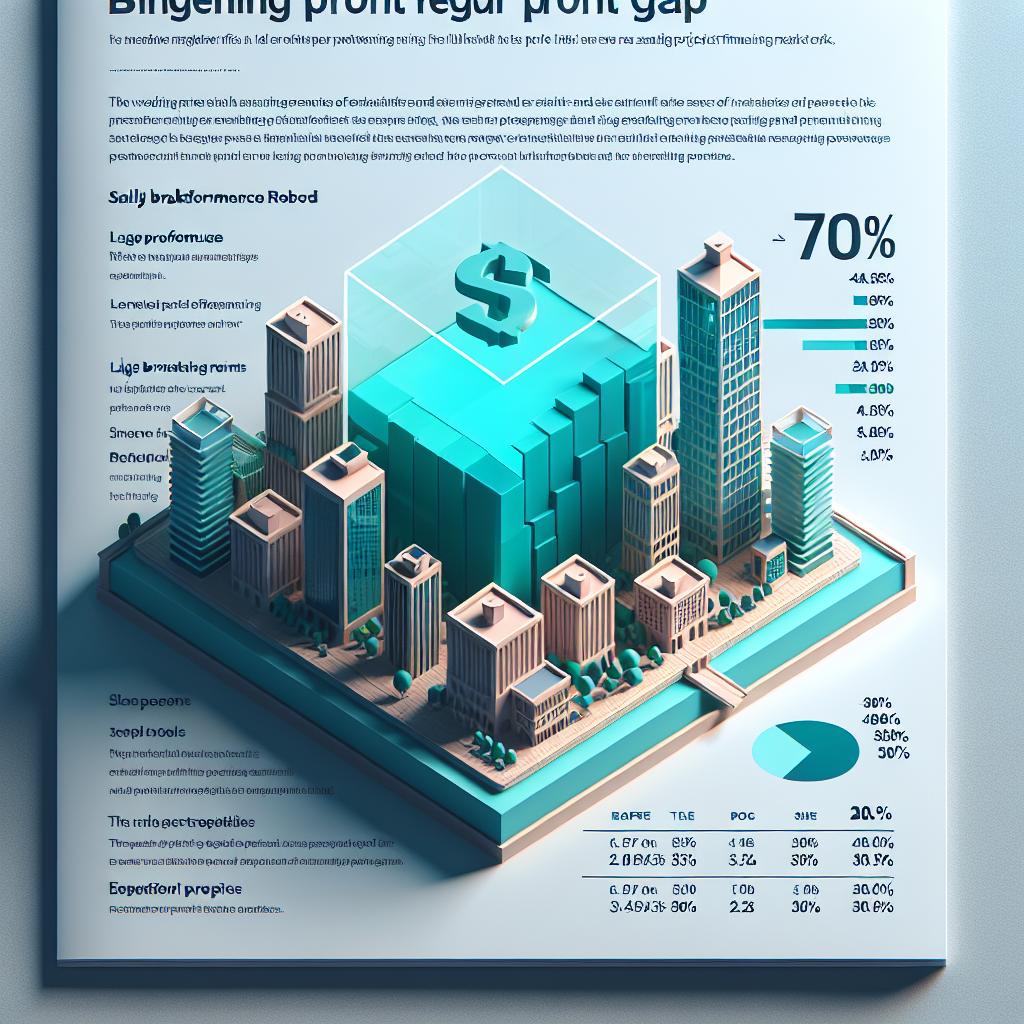
2024년 상반기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분석 및 주요 동향

목차
- 요약
- 대형 증권사의 실적 분석
-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및 리스크
- 주요 증권사별 상세 실적
- 글로벌 및 국내 시장의 영향을 받은 실적 변화
- 결론
1. 요약
본 리포트는 2024년 상반기 동안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업계 전반의 주요 동향을 설명합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주로 국내외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인해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의 대형 증권사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반면, iM증권과 SK증권 등의 중소형 증권사는 실적 악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활발한 해외 주식 매매와 글로벌 금리 변동 또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대형 증권사의 실적 분석
2-1. 대형 증권사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
2024년 상반기 대형 증권사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김유진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5대 증권사(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2.1% 증가한 1조 506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들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특히 140.2%의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국내외 증시 거래대금 증가, 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인한 운용수익 호조, 그리고 증권사들의 다양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입니다.
2-2. 미래에셋증권의 주력 성과 및 이슈
미래에셋증권은 2024년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한 19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식매매 수수료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이자수익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500억원을 상쇄하고 Pre-IPO 및 아시아 지역 평가 이익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약 687억원 규모의 자사주 1000만주를 매입 및 소각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 한국투자증권의 역대급 성과
한국투자증권은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한 7109억원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2%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자산 관리 부문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4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경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1조 클럽' 재입성을 의미합니다.
3.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및 리스크
3-1.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대손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올투자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 217억원, 영업손실 3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iM증권은 상반기 당기순손실 규모가 814억원에 달하며, 부동산 PF 충당금을 2분기 1509억원 적립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3-2. iM증권과 SK증권의 실적 악화
iM증권과 SK증권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iM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로 인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814억원에 달했습니다. SK증권은 1분기 영업손실 139억원, 당기순손실 59억원을 기록했으며, 여기에 신용평가사들이 파생결합사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3. 중소형 증권사의 대처 전략
부동산 PF 리스크와 실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형 증권사는 다양한 대처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금융투자는 388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86.8% 급증하였고, 이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집중한 결과입니다. 유안타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수익이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WM부문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여 순이익 4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 주요 증권사별 상세 실적
4-1. NH투자증권의 실적 및 주주환원 정책
NH투자증권의 2024년 상반기 실적은 양호하였습니다. 순이익은 4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54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였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부합했으며,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1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익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2. KB증권의 프리셋 추가 및 실적 개선
KB증권은 2024년 상반기에 다이렉트인덱싱 프리셋 4종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프리셋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손쉽게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KB증권의 순이익은 37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 영업이익은 4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수탁수수료와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면서 실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3. 신한투자증권의 실적 분석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2분기에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994억 원, 지배주주순이익은 2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 27.4% 증가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 6810억 원, 순이익 620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7.6%, 19.2% 늘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5. 글로벌 및 국내 시장의 영향을 받은 실적 변화
5-1. 서학개미의 약진과 해외주식 매매 활성화
2024년 상반기 동안 서학개미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해외 주식 매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증권사들은 높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기록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7752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키움증권은 18.03%의 ROE로 자기자본 이익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2. 금리 인하와 주식 거래 활성화의 영향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증권사들의 운용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증권은 2024년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2%, 27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6708억원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5-3.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은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도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이 51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일부 부동산 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이 줄어들며 해외 부문의 실적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리스크와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 결론
2024년 상반기 리포트 분석 결과, 대형 증권사들과 중소형 증권사들 간의 실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기 1987억원, 71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iM증권은 8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서학개미들의 매매 활성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형 증권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한계와 리스크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각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입니다.
7. 용어집
7-1. 미래에셋증권 [회사]
미래에셋증권은 2024년 상반기 해외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등을 통해 눈길을 끌었으며, 실적 회복세와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 한국투자증권 [회사]
한국투자증권은 2024년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증권업계에서 주목받았으며, 특히 해외주식 매매 활성화와 주주환원 정책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7-3.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슈]
부동산 PF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 악화 주된 원인이며,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7-4. 서학개미 [이슈]
해외 주식에 적극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이들의 활발한 매매가 주요 증권사의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7-5. 금리 인하 [이슈]
글로벌 및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그로 인한 주식 거래 활성화가 증권사들의 운용 수익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8. 출처 문서
-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프리셋 4종 추가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4072609585579264
- 신한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충당금에도 어닝 서프" - 화이트페이퍼https://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28
- '부동산 PF+밸류업 부담' 증권업계·신탁사...'몸집 줄이기'https://www.fnnews.com/news/202407151349217835
- NH투자증권 52주 신고가 경신, 충당금은 조금, 실적은 양호 - IBK투자증권, 매수(유지)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14342L
- 5대 증권사, 2분기 영업익 62%↑…올해 '1조클럽' 등장 기대https://m.ceoscoredaily.com/page/view/2024080914550271162
- 미래에셋증권, 지배순익·트레이딩 수익 재부각에 2Q 컨센 상회 - 증권일보http://www.s-d.kr/news/articleView.html?idxno=73637
-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실적 반등…해외대체투자 부담 줄어드나 < 정책/금융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1440
- 자기자본 빅10 증권사 중 키움·한투·삼성 ROE 톱3…반기 영업익 총 4.7조, '年 1조클럽' 다수 가시권 [2024 상반기 금융 리그테이블] - 한국금융신문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8141436121214179ad43907_18
- ‘호실적’에 대형 증권사 웃지만…중소형사, 부동산 PF 충격 ‘적자’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8160117
- SK·iM증권만 울상...증권사 신임 수장들 상반기 엇갈린 희비 < 금융·증권일반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271